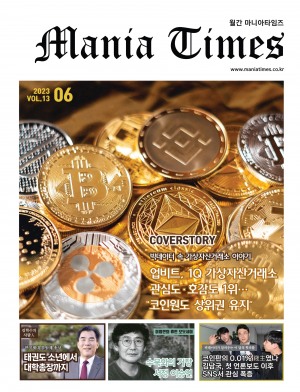그 쪽빛 하늘과 야트막한 산을 벗삼아 빨간 홍시 몇 개를 안고 있는 뒷담 감나무는 한 폭의 그림이다.
시골 고향을 생각나게 하는 대표적 풍경 중의 하나이지만 하늘 끝에 걸린 여남은 홍시는 하찮은 미물까지도 생각하는 우리네의 속깊은 정서이기도 하다.
‘찬 서리/ 나무 끝을 나는 까치를 위해/ 홍시 하나 남겨둘 줄 아는/ 조선의 마음이여’
시인 김남주가 ‘옛 마을을 지나며’에서 읊었듯 옛날 어른들은 반드시 몇 개는 남겨두고 감을 땄다.
‘까치밥’이라는 것인데 원래는 효성이 지극하여 늙은 부모 새를 죽을 때까지 보살핀다는 까마귀를 위한 것이었고, 그래서 일부지방에선 아직도 ‘까막밥’이라고도 한다.
아마도 까치가 사람 동네에서 살며 친숙해진 길조여서 바뀐 것이 아닌가 싶은데 까치밥이든 까막밥이든 그것은 이제 본격적으로 겨울이 시작되면 먹을 것 구하기가 쉽지 않을 날짐승들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였다.
짐승들을 위해 가을걷이가 끝난 벌판에 이삭을 다 줍지 않고 내버려두는 것과 같은 마음이다.
수년전 민주당 대선후보 대전 경선에서 당시 노무현 후보 등이 충청도 사람들의 인심을 들먹이며 ‘까치밥을 좀 남겨달라’고 해서 화제가 된 적도 있지만 까치밥은 약자를 배려하는 우리네의 따뜻한 마음과 나누면서 세상 사는 이치를 담고 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아이들이 몰래 까치밥을 딸려고 하면 ‘인정머리 없는 놈’이라며 야단치곤 했다.
언젠가 한국생활이 제법 된 외국인이 ‘푸른 하늘, 마른 가지, 빨간 홍시의 조화’를 가장 아름다운 한국의 늦가을 정취로 꼽았다.
그러면서도 그는 남은 홍시를 감나무 주인의 게으름 때문쯤으로 알고 있었다.
그러나 까치밥의 이유를 설명하자 “한국인의 마음은 그 풍경보다 더 아름답다”며 새삼 존경심을 나타냈다.
세상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갈등은 매일 쏟아진다.
모두들 자기주장에만 목청을 높이고 있다.
곧 엄동설한이 닥치겠지만 현실은 그보다 더 춥다.
차가운 홍시에 담긴 따뜻한 마음의 까치밥이 그래서 더 그립다.
[이신재 마니아타임즈 기자/20manc@maniarepor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