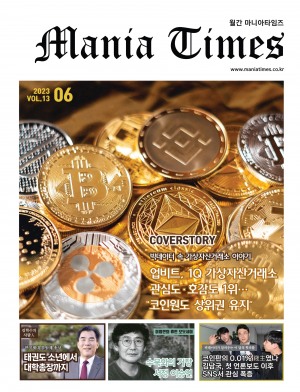소백산맥 연화봉과 도솔봉 사이를 힘겹게 넘는 죽령(해발 689m)은 경북 영주시 풍기읍과 충북 단양군 대강면을 잇는 고개를 말한다. 옛날 문경새재·추풍령과 함께 영남의 3대 관문이었다. 영남 내륙의 여러 고을 사람들이 서울로 향하기 위해 이 길을 거쳤고, 각종 물건을 등에 짊어진 보부상들의 이 고갯길을 넘나들었다.
‘죽령(竹嶺)’이란 이름은 그 옛날 고개를 넘던 도승이 너무 힘들어 짚고 가던 대지팡이를 꽂은 것이 살아났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하지만 정작 죽령에는 대나무를 찾아볼 수가 없다. 왜 죽령이라 불렸을까 궁금증이 생긴다. ‘삼국사기’에는 ‘아달라왕 5년 3월에 비로소 죽령길이 열리다’라 기록돼 있고, ‘동국여지승람’에는 ‘아달라왕 5년에 죽죽(竹竹)이 죽령길을 개척하고 지쳐서 순사(殉死)했고, 고갯마루에는 죽죽을 제사하는 사당(竹竹祠·죽죽사)이 있다’고 기록됐다. 죽령은 이 길을 개척한 사람의 이름에서 비롯됐다는 얘기도 전해진다. 2000여 년 세월 동안 영남 내륙을 이었던 이 길은 새 길과 터널이 뚫리면서 말 그대로 옛길이 된 지 오래다.
죽령을 40년만에 찾은 것은 이곳이 고향인 대한체육회 박춘섭 사무총장의 초대를 받아서혔다. 박 사무총장은 여기 화전민 터에서 태어난 토박이다. 소백산 깊은 계곡에 자리잡아 하늘이 만평도 보이지 않는 경사진 땅에서 자란 그는 어릴 적 산에서 놀고 계곡에서 고기 잡던 추억을 잊을 수 없다. 그는 초등학생 때 고향을 떠나 대전에서 공부하며 대전고,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행정고시에 합격해 기재부 정통 공무원으로 수십년간 근무하며 조달청장을 역임하고 퇴직했다가 올해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을 맡았다. 그에게 죽령은 육체적 삶의 터이자 정신적 고향이었다. 객지에서 힘들 때 고향을 생각하면 새로운 활력소를 갖게됐다고 한다.
11월 초 ,깊어 가는 늦가을 둘러본 죽령은 군 시절에 봤던 것과는 너무나 달라 말 그대로 ‘상전벽해’를 이루었다. 죽령을 관통한 죽령터널과 고속도로가 변화의 중심에 있었다. 하지만 파란 하늘, 울창한 나무, 깊은 계곡 등 자연은 말없이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죽령 옛고개 마을에서 산메기 매운탕을 곁들인 별식
박 총장이 처음 안내한 곳은 죽령 옛고개마을에 위치한 마을회관이다. 옛 고개마을의 공식 지명은 충북 단양군 대강면 용부원리다. 과거 화전민들의 터전이었던 이 마을의 본래 이름은 버들밭마을. 고산 습지에 버들이 서식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세월이 흐른 지금, 2013년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 6호로 지정된 후 찾아오는 이들이 제법 많아 때 묻지 않은 청정 마을이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했다고 한다. 마을에는 드문 드문 텅 빈집들이 보였다. 겉보기에 딱히 볼 게 없다. 개발이 덜 된, 때 묻지 않은 전형적인 산촌이다. 한때 용부원리는 170여 가구가 사는 큰 동네였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은 30여 가구가 사과 농사를 짓고 산채와 약초를 팔고 민박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박 총장과 어릴 적 친구인 마을 이장 등이 일행 등을 반갑게 맞이했다. 마을 이장은 “우리 마을에서 박 총장은 고향을 빛낸 자랑스러운 인물이다. 그 어렵다는 고시에 합격하고 중앙부처에서 고위 공무원을 하면서도 항상 고향 민원이 발생하면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신경을 쓰고 해결해주었다”며 “고향을 진정으로 생각하고 아끼는 마음에 마을 사람들이 모두 감동을 많이 받는다”고 말했다.
점심상으로 이곳 계곡에서 직접 잡은 산메기탕이 올라왔다. 산메기는 많은 산 계곡물에서 자라는 토종 민물고기로 일반 메기에 비해 절반 정도 크기이다. 주로 밤낚시나 통발어망으로 잡는다. 강렬하게 맵고 얼큰 달달한 맛이 난다. 잡히는 양도 그렇게 많지 않아 귀한 매운탕으로 1년에 몇 번 정도 먹을 수 있다고 한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죽령 옛 숲길
식사를 마치고 죽령 옛 숲길을 걸었다. 잘 만들어진 나무 데크길이 갖춰져 있었으며, 아름드리 나무들이 빽빽이 들어차 있었다. 계곡을 따라 20여분 내려가자 죽령 터널 입구까지 다달았다. 숲길 사이로 터널 입구와 쭉 뻗은 고속도로가 보였다. 현대화의 물결이 깊은 숲속까지 미쳤음을 알 수 있었다.
나무 데크 길을 호위하듯 늘어선 숲은 짙고 푸르러 눈이 시리다. 박 총장은 “이곳 숲길에서 명상을 하며 걸으면 정신적 위안을 얻을 수 있다”며 ‘몸과 마음이 찌든 도시인들에게 힐링 쉼터로 이 숲길을 추천하고 싶다“고 말했다.

잠시 옛 고개를 돌아 보면서 40년전 군대시절의 추억을 더듬어봤다. 칠흙같은 밤, 무거운 군장을 메고 기자를 비롯한 공수부대원들이 전술훈련을 하면서 이 고개를 넘었다. 당시는 낯설고 물설은 지역이라 죽령 두 글자만 뚜렷히 기억났다. 하지만 산세가 어떻게 생겼는지, 계곡은 어떤 모양이었는지는 전혀 생각나지 않았다.
마을 이장은 “수년 전까지만 해도 공수부대원들이 한밤중에 저벅저벅 군화소리를 내며 바쁘게 지나가던 것을 볼 수 있었다”며 “한번은 다리가 불편한 공수부대원 팀이 집을 찾아와 차량 제공을 부탁해 실어준 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수부대원들이 요즘에는 이곳을 찾지 않는다고 했다.
박 총장은 이 마을과 관련한 전통 설화를 소개해주었다. 죽령은 삼국시대 이래로 봄과 가을에 제사를 지내던 곳으로 조선 시대에는 죽령사라는 산신당이 있었고, 지금도 옛 고개마을 입구에 산신당이 터를 잡고 있다고 한다. 일명 ‘죽령 산신당’이라고 부르는 산신당은 죽령고개의 도둑 떼를 물리치게 해준 다자구 할머니가 죽어서 죽령산신이 됐다고 해서 이를 기리기 위해 제사를 모시는 곳이라는 것이다.
‘옛 고개마을은 복원된 죽령옛길 덕에 외지인들의 발길이 점차 늘고 있다. 비록 이렇다 할 볼거리는 없지만 때 묻지 않은 오지의 인심을 만나 호젖하게 즐길 수 있는 곳이다. 요즘처럼 세상이 하수상할 때 잠시 머리 식히기에 딱 좋은 ’마음의 쉼터‘ 같은 곳이다.
[김학수 월간마니아타임즈 편집국장 kimbundang@maniarepor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