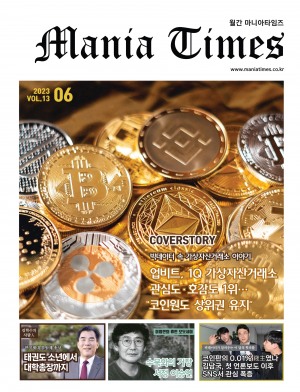![[VOL.11] 도둑같이 불행이 찾아와도....잃어버리는 기쁨도 있다](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23032013581505658a5b6bbcc6e10625221173.jpg&nmt=88)
고통과 슬픔은 '도둑처럼' 어느날 갑자기 불현듯, 남몰래 들이닥친다. 예정에도 없었고 계획에도 없었으며 그것을 희망한 적은 더더군다나 없었는데도, 그런데도 찾아 온다.
불행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다. 도둑 같이, 나의 건강과 행복, 그리고 몇 줌 안되는 잔돈 부스러기까지도 앗아가곤 한다.
도둑 같은 불행은, 저 홀로 오지도 않는다. 동무들과 손에 손을 잡고 한꺼번에 몰려온다. 희한한 일이다. 그런 희한한 일들이 매일 매일 일어난다.
그래도, 이겨내고 견뎌내는 사람들을 보면서 힘을 얻는다. 나도, 이기고 견뎌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다.
'상실의 기쁨'(원제: The beauty of Dusk)은 시력을 잃고 절망에 빠졌으나 기쁨을 발견하고, 인생을 긍정하는 내용을 담은 에세이다.
책은, 인생의 황혼이 얼마나 역설적이고 풍부하며 아름다울 수 있는지 전해준다.
프랭크 브루니는 미국 뉴욕타임스의 간판 칼럼니스트였다. 백악관 담당 기자, 로마 지국장, 음식 평론가로 활약했다. 명성도 높았다.
인생은 늘 그렇게 좋은 시절만 있는 줄 알았다. 그런데 웬걸, 그게 아니었다.
암이 찾아왔고, 어깨 염증으로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아야만 했다.
그래도 일은 줄이지 않았다. 주당 50~60시간을 일했다.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약을 구했고, 운동량을 조절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오른쪽 눈이 보이지 않았다. 여러 병원을 찾아 다녔지만 병명조차 알 수 없었다.
대학병원에서 종합검사를 받은 끝에 '비동맥성전방허혈성시신경병증'(NAION)이라는 병명을 진단받았다.
혈압이 갑작스레 떨어지면서 시신경 일부에 혈액이 공급되지 않는 희소병이었다. 치료제도 없고, 수술도 할 수 없는 병이었다.
운동도 소용이 없었다. 잘 보이지 않다가 마침내 실명하는 병이었다. 설상가상, 왼쪽 눈에도 같은 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40%나 된다고 했다.
두려웠다. 읽고 쓰는 게 직업인 그로서는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삶은 바닥으로 곤두박질쳤다.
삶의 버팀목이었던 아버지는 알츠하이머병에 걸렸다. 애인인 톰은 바람이 났다. 삶의 즐거움이었던 읽기는 쉽지 않고, 글쓰기는 더욱 어려워졌다.
임상시험에 참여해 고통스럽게 주사를 맞았지만, 호전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다. 규칙적이고 정갈했던 삶은 엉망진창, 만신창이가 되었다.
만나던 사람들도 달라졌다. 주목받는 정치인이나 연예인과 매일 만나다시피 했던 그였다.
그러나 이제, 눈이 보이지 않거나 다른 질병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삶과 마주했다. 파킨슨병에 걸린 친구, 눈이 먼 외교관 등을 만났다.
그들과의 만남을 통해 "고난을 도전으로 재구성하는 삶의 태도"를 배웠다.
"내가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을 정말 믿을 수 없다"에서 "내가 이런 상황을 헤쳐 나가는 것을 정말 믿을 수 없다"로 바꿔서 생각하기 시작했다. 세상을 보는 자세를 바꾼 것이다.
마음의 시각을 교정하자 삶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졌다. 역경도 그저 삶의 일부분이라고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삶이 무슨 패를 돌릴지 결코 알 수 없기에 그저 그런 변화에 적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시력은 계속 흐릿해져 갔지만, 삶을 바라보는 마음의 눈은 오히려 더 넓어졌다.
"삶이 시다 못해 쓰디쓴 레몬을 내민대도 당신은 그것으로 레모네이드를 만들 수 있다. 이것은 내가 얻은 큰 배움이었다."
"언제나 이웃집 잔디가 더 푸르게 보인다는 것도, 구름의 저편은 늘 은빛으로 빛난다는 것도, 밤은 새벽이 오기 전에 가장 어둡다는 것도 비로소 깨달았다."
웅진지식하우스. 홍정인 옮김.
[전경우 월간마니아타임즈 기자/ckw862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