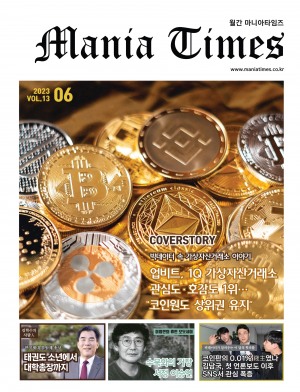![[VOL.14][권혁재의 '핸드폰에 담는 우리 꽃 100'] 우리나라 토종 야생화- 비비추](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23120410170206062bf6415b9ec1439208141.jpg&nmt=88)
30cm 넘는 것을 한 앵글에 넣으면 쓸데없이 배경은 넓어질 겁니다. 배경이 넓고 어수선하면 꽃 또한 함께 어수선해집니다.
꽤나 흔한 꽃인데 조 작가의 설명을 들어보니 느낌이 달랐습니다.
“요즘 도시에 많고 자연에서는 보기 어렵기에 대부분 원예종이라 생각하겠지만 저 친구도 우리 꽃이에요. 잎이 비비 꼬여서 나서 비비이고 취나물을 의미하는 ‘취’가 ‘추’로 바뀌어 비비추입니다. 일월비비추라고 깊은 산에 사는 우리 꽃이 있어요. 나중에 그 친구랑 묶어서 이야기하는 것도 재미 있을 거예요.”
듣고 보니 아뿔사 싶습니다. 서양 원예종이 아니고 우리 꽃이었습니다. 무식함 때문에 비비추를 알아보지 못한 게 계속 마음에 걸렸는데, 오래 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남산에서 비비추 잎이 땅을 뚫고 오르는 것을 찍은 적 있었습니다. 땅에서 올라오은 친구들을 위에서 내려다보니 잎이 하트 모양이라 눈길이 갔습니다. 그리고 좀 더 잎이 오른 후 봤을 땐, 잎끼라 부둥켜안고 비비 꼬인 모양새였습니다.
![[VOL.14][권혁재의 '핸드폰에 담는 우리 꽃 100'] 우리나라 토종 야생화- 비비추](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23120410172200639bf6415b9ec1439208141.jpg&nmt=88)
아마도 이 모양새 때문에 비비추라는 이름을 얻은 건가 봅니다. 그리고 무성한 잎에 빗방울이 맺힌 사진을 찍어둔 기억까지 떠올랐습니다.
생각이 여기에 미쳤을 때 마침 비가 왔습니다. 우산 받쳐 들고 남산에 올랐습니다. 함초롬히 젖은 비비추가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서양 원예종이라 짐작하여 눈길 주지 않았던 때와 달리 참으로 고왔습니다. ‘알고 보면’이란 말이 마음에 여실히 와닿은 순간이었습니다.
만개한 꽃과 젖은 잎은 한 앵글에 넣었습니다. 꽃은 물론이거니와 잎도 흠뻑 젖은 그들, 보는 것만으로도 싱그럽습니다. 사실 아는 만큼 보이듯 아는 만큼 사진 찍는 겁니다.
사진 테크닉이 아무리 뛰어나도 모르면 못 찍기 마련이죠. 알고 보면 다르게 보이는 게 사진이니까요.
비비추
분류/ 백합과
서식지/ 산지 냇가
개화시기/ 7월~8월
꽃색깔/ 보라색
산지에서 내려와 원예화에 성공한 대표적인 꽃이다. 야생화는 야생에서 봐야 한다고 믿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가 꽤 있다. 깊은 산 계곡 여름 냇가 바위틈에 서 보는 비비추는 크기가 작고 풍취도 다르다.
[이신재 마니아타임즈 기자/20manc@maniareport.com]